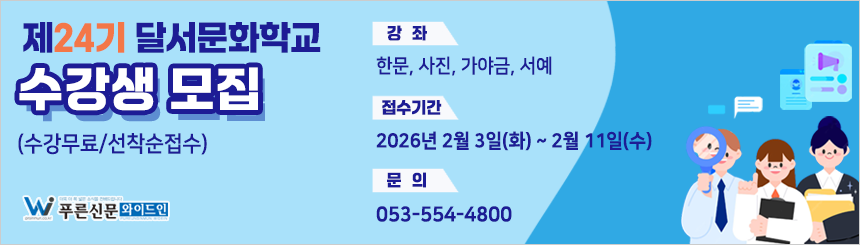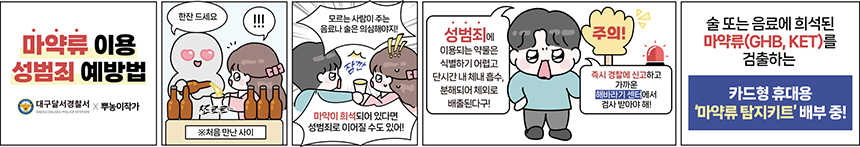제를 올리기 앞서 경건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후손들 모습 [사진=이현아 기자]
제를 올리기 앞서 경건하게 마음을 가다듬는 후손들 모습 [사진=이현아 기자]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에는 박성양(朴成陽)* 을 제향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세워진 명곡서원(明谷書院)이 자리하고 있다.
*박성양(朴成陽) :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한 인물로 도학이 높고 충절이 뛰어나 남쪽 왜구와 북쪽 오랑캐를 평정해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곡서원은 가음면 사무소에서 금성현서로를 따라 약 1㎞를 직진하면 오른쪽 명곡서원길 표지판과 함께 주택과 논 사이 좁은 길을 따라 약 100m쯤 올라가면 위치해 있다.
매년 신년을 맞아 알묘제(謁廟祭)가 열리는 여기에 후손 10여 명이 모여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명곡서원보존회 박연탁(81) 회장이 명곡서원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선조를 기리는 전통의 중요성을 전했다.
 신년 알묘제에서 초헌관을 맡은 명곡서원보존회 박연탁 회장 [사진=이원선 기자]
신년 알묘제에서 초헌관을 맡은 명곡서원보존회 박연탁 회장 [사진=이원선 기자]
“의성 명곡서원은 박성양 선생 한 분만을 모시고 있다. 박성양의 본관은 함양(咸陽)으로 호는 금은(琴隱)이며,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학문에도 능했고 성리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 하지만 스승인 포은의 죽음과 고려의 멸망에 절망하여 송도를 떠나, 고향인 경북 의성 봉양 봉두산 아래 엄자현(俺紫峴)에 들어와 은거했다. 거문고와 책을 벗 삼아 즐기며, 조선 태조 이성계의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스스로 ‘금은(琴隱)’이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려말 28은(二十八隱) 중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전장으로
“조선 태조의 부름에도 끝내 출사를 사양하던 박성양 선생에게 반전의 때가 온다. 태조 6년(1397) 5월, 왜구가 남해안에 침입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무를 겸비한 용맹한 인재로 왜적을 격퇴할 이 박성양뿐이라는’ 조정의 천거에, 태조는 그를 왜구 정벌의 원수로 삼았다. 나라의 어려움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외면할 수 없던 그는 급히 군사를 거느리고 부산포로 달려갔다. 분전에 분전을 거듭하여 60일 만에 왜구를 소탕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을 알현하니, 태조는 기쁨에 겨워 직접 시를 지어 하사했다. 그 시가 바로 ‘삼척검두 영사직 일조편말 정건곤(三尺劍頭 寧社稷 一條便末 定乾坤) 3자의 큰 칼로 사직을 안정시키고 한줄기 채찍 끝으로 천하를 평정하였네’이다. 세종 원년(1419)에 다시 왜구가 침입하자, 우군 절제사를 맡아 거제도 두지포에서 적들을 무찔렀다. 이에 왕이 가선대부이조참판 겸 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吏曹參判 兼 都摠府副摠官)을 제수했다.”
 정헌공 금은 박성양 선생에게 제를 올리는 후손들의 모습 [사진=이현아 기자]
정헌공 금은 박성양 선생에게 제를 올리는 후손들의 모습 [사진=이현아 기자]
◆ 후대에까지 칭송, 시호는 정헌공
“회재 이언적(李彦迪)은 묘지명(墓誌銘)에 ‘학문은 천인을 관통하고 공을 세워 사직(社稷)을 보존했네. 거문고와 책으로써 만년(晩年)을 지내셨으니. 거룩하도다! 세운 공이여’ 하며 칭송할 정도로 선생은 문무를 겸한 당대 최고의 지략가이기도 하다. 고종 5년(1868)에 이르러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의금부사(資憲大夫吏曹判書 兼 義禁府事) 성균관제주(成均館祭酒)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의 증직(贈職)과 시호(諡號)를 정헌공(定憲公)이라고 함께 내렸다.”
집례관은 하나한 의식을 의미를 설명하며 집전한다. [사진=이원선 기자]
◆ 의성군 문화유산 제37호 명곡서원
“명곡서원은 박성양(朴成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역민의 교육과 후진 양성을 위해 순조 18년(1818) 창건하고 철종 2년(1851)에 사액을 받았다. 고종 5년(186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어 ‘명곡서당’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1975년 각 유림의 뜻을 모아 ‘명곡서원(明谷書院)’으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곡서원은 강당의 후면으로 사당이 배치된 전학후묘의 형태이다. 경덕사(景德詞)인 사당과 명교당(明敎堂)인 강당, 향도재(向道齋)인 동재, 강의재(講義齋)인 서재, 전사청, 문간채 등 총 6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당인 경덕사는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익공 양식을 취하고 있다. 강당인 명교당은 팔작지붕에다 겹처마이다. 민도리형식이며 굴도리를 사용했다. 가운데 2칸은 대청으로 마루를 깔았다. 동재인 향도재는 팔작지붕에다 홑처마이다. 민도리형식이다. 서재인 강의재는 동재와 비교하여 그 규모나 양식이 비슷하다. 팔작지붕에 홑처마이고 민도리형식이다. 맨 북쪽의 1칸에만 사분합문을 달았다. 전사청은 맞배지붕 겹처마이다. 현판에 '유정문(由正門)'이라 쓰여있는 외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으로 맞배지붕이다.
◆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넘어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지금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윤리·도덕이다. 윤리·도덕이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는다. 이제 다시 유교의 근본이념인 윤리·도덕에 주목해야 한다. 윤리·도덕을 선양하여 인간 본래의 선함을 일깨우고자 노력해야 한다. 공자가 이야기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또한 배려하고 용서하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유학이념과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우리 문화를 창출해 아름답게 꽃피우고 이끌어갈 수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넘어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나아가는 미래 세대가 되길 희망한다.”
박 회장의 미래 세대를 향한 당부다.
명곡서원의 모습 [사진=이현아 기자]
제의를 여미는 매듭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예를 중시하는 그 밑바탕에는 사람을 향한 존중이, 조상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의례’의 뒷면에는 ‘사람’과 ‘마음’이라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 숨어 있다.